etc.
[펌] 이직
keyword77
2013. 8. 21. 12:33
[직장인 심리학콘서트]왜 이직하면 전 직장이 그리워질까?
시티라이프 입력 2013.08.21 10:45유 과장은 최근에 B사로 이직했다. A사에서는 7년간 일했고, 첫 직장이었던 만큼 정도 많이 들었다. 하지만 B사는 규모가 훨씬 컸고, 최근 힘을 몰아주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써 무게를 실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연봉도 이전보다 높았다. 그런데 들어오고 보니 이게 웬 일인가. 연봉은 고작 몇 만원 차이가 날 뿐이었고, 지원은커녕 업무는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었다. 도중에 들어온 자신은 부서 분위기에 쉽게 융화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자신을 뽑아 준 박 이사는 끊임없이 '유 과장, 그대의 실력을 보여주게!'하고 부담을 준다. 미운 정 고운 정 들었던 A사는 오랫동안 근무했기에 익숙한 점도 있었고 업무를 요령 있게 처리하기도 유리했었는데...' 본인이 선택한 것이니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막하다.
행복하기 위해 한 결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물건 고를 때를 떠올려 보자. 지구 환경에 기여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몇 년째 에어컨 없이 버티던 당신은 결국 해가 다르게 심해지는 더위에 못 견뎌 에어컨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왕 사는 것 전력 절감도 되고 나의 재정 상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사고 싶어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 블로그를 뒤져 사용후기도 읽어보고 몇 날 며칠 정보를 모은 끝에 두 기종을 고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서 '넌 뭘 샀니'라며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A를 구매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고장이라면 질색하는 당신은 B를 사기로 결정한다.
당신은 A와 B의 고장률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지인이 한 말, A가 고장이 잦다는 건 그에게만 해당하는 걸지도 모른다. 블로그의 글 역시 신뢰하기는 어렵다. A, B를 판매하는 회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라 당신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직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조건이 비슷한 두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고민이다.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로 결정할 수도 없고, 친분 있는 동종업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그가 "나라면 무조건 A사를 택할 것이다. B사에는 직원 관리와 업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더라"라며 강력히 A를 추천하자 당신은 그대로 따른다.
정말 B사에는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애초에 면접을 제의한 이가 제시한 조건을 믿을 수는 있는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챙기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문제가 있는 집의 매도를 부추기는 것처럼, 혹시 과대포장은 아니었을까? 정보는 절대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정보의 신뢰도를 측정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에 쥔 정보의 수도 서너 개. 몇 개의 불명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내딛는 걸음,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던데… 또 하나의 이유는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다. '하던 대로 해'라는 말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 중에도 쉽게 들린다. 자주 가던 식당에 가는 게 마음 편하고, 별 문제 없는 한 애인을 바꾸는 것도 내키지 않으며, 몇 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회사를 굳이 바꿔야 하나 아리송하다. 변화를 시도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의 후회가, 현 상태를 유지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동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파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 이직 후 결과가 좋지 못하면 후회가 깊은 것도 그래서다.
이직 스트레스 이렇게 날려보자 3 STEP
1. 버나드 쇼는 말했다. 할 수 있는 자는 행하고 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친다고.
새 조직에 들어서면 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하게 된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주말도 반납하고 일한다. 이동 거리가 멀어졌다면 출퇴근 시간도 바뀌고 전철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진다. 인간관계도 다시 쌓아야 한다.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전 직장의 익숙함이 그리워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한다.
그러나 '뜀뛰기를 잘못했다'는 암담함은 잠시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길로비치(T. Gilovich)와 빅토리아 메드벡(V.H. Medvec)의 연구 결과(The Experience of Regret: What, When and Why, 1995)를 보자. 이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더욱 후회했는데, 그 비율이 90%에 달했다. 실제로 실행한 것에 대한 후회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길을 헤맨 것보다는 다른 길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깊었다는 뜻이다. 이직한 뒤에 예상과 다른 전개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가? 만약 이직을 포기하고 이전 회사에 머물렀다면, 나중에는 회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후회가 발목을 잡는다. '왜 그때 용기 있게 이곳을 박차고 나가지 못했나!'라는 자책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것보다 진하다.
2.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자
이직한 회사에서 문제가 속속 발견되면 다른 회사를 다시 알아봐야 할까? 그보다는 현재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겠다.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대니얼 길버트(D. Gilbert)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사진을 선택하게 했는데, 한 반에는 사진을 한 번 선택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일러줬고 다른 반에는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줬다. 이후 사진에 대한 만족도를 검증해보았더니 선택을 다시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그들의 선택에 보다 흡족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괴로워진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재이직을 시도하면 또 다른 좌절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점프를 자꾸 하면 무릎관절염을 얻게 되듯, 계속되는 환경 변화는 만족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철새의 낙인, 역마의 짐으로 되돌아온다.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며 지금 회사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에 만족하고 안정을 찾게 되는 비법이다.
3. Black, 그 매력적인 색
나의 선택은 검은 색이었다고 자책하고 있는가? 더 밝은 색, 매력적인 색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사실 검은색은 창조의 바탕이며 변화의 시작이다. 검정의 명도는 0인데, 0은 기준점이며 양수와 음수의 구별점이다. 어떤 색과 섞어도 검정색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색들과 구별된다. 이직 후의 고민은 당연하며, 다른 직급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면 더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로 선을 그은 다음에는 현재 회사의 장점을 찾아보자.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것은 갑갑한 벽이 빛을 가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검고 광대한 우주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글 이현수(일상 심리 전문 작가) 사진 포토파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392호(13.08.27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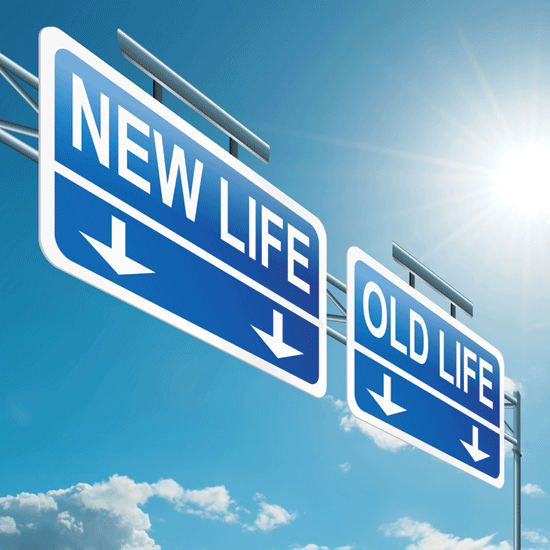
'Back to Black'이라는 곡이 있다. 2011년 이맘 때쯤 생을 마감한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다. 그녀는 알앤비와 소울, 재즈를 혼합한 스타일로 주목받고, 그래미에서 5관왕에 올랐으며, 한 세대에 한 명 나올까 한 천재 뮤지션으로 칭송받았다. 반면 그의 사생활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았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 폭행 등 다양한 사고를 쳤으며 결국 지미 헨드릭스, 재니스 조플린, 짐 모리슨, 커트 코베인이 그랬듯 27살의 나이에 요절했다. 평탄하지 않았던 삶이 반영된 'Back to Black'에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나온다. "넌 그녀에게 돌아가고, 난 어둠으로 돌아갈게." 이직 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직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만 알았다. 연봉도 좀 더 높았고 제시받은 직급도 이전보다 높았으며, 전망도 반짝거려 보였다. 지금의 직장보다 나아 보였기 때문에 갈아탔다. 더 나은 조건을 향해 항해하는 것은 바다를 표류하는 자의 당연한 임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런데 웬일인가. 새 조직은 예상과 전혀 달라 배신감 들고, 텃세나 과도한 기대로 적응까지 어려우니 점점 심란해진다. 원래 직장에 그대로 있을 것을, 괜히 이직을 결정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행복하기 위해 한 결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물건 고를 때를 떠올려 보자. 지구 환경에 기여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으로 몇 년째 에어컨 없이 버티던 당신은 결국 해가 다르게 심해지는 더위에 못 견뎌 에어컨을 사기로 결정했다. 이왕 사는 것 전력 절감도 되고 나의 재정 상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사고 싶어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 블로그를 뒤져 사용후기도 읽어보고 몇 날 며칠 정보를 모은 끝에 두 기종을 고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서 '넌 뭘 샀니'라며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가 A를 구매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고장이라면 질색하는 당신은 B를 사기로 결정한다.
당신은 A와 B의 고장률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다. 지인이 한 말, A가 고장이 잦다는 건 그에게만 해당하는 걸지도 모른다. 블로그의 글 역시 신뢰하기는 어렵다. A, B를 판매하는 회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라 당신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직 과정도 이와 비슷하다. 조건이 비슷한 두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 고민이다.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로 결정할 수도 없고, 친분 있는 동종업계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그가 "나라면 무조건 A사를 택할 것이다. B사에는 직원 관리와 업무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더라"라며 강력히 A를 추천하자 당신은 그대로 따른다.
정말 B사에는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애초에 면접을 제의한 이가 제시한 조건을 믿을 수는 있는가?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챙기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문제가 있는 집의 매도를 부추기는 것처럼, 혹시 과대포장은 아니었을까? 정보는 절대적이지 않다. 사람들은 정보의 신뢰도를 측정해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손에 쥔 정보의 수도 서너 개. 몇 개의 불명확한 정보에 의존하여 내딛는 걸음, 장애물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던데… 또 하나의 이유는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의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을 아주, 아주 싫어한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다. '하던 대로 해'라는 말은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생활 중에도 쉽게 들린다. 자주 가던 식당에 가는 게 마음 편하고, 별 문제 없는 한 애인을 바꾸는 것도 내키지 않으며, 몇 년 전부터 거래하고 있던 회사를 굳이 바꿔야 하나 아리송하다. 변화를 시도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의 후회가, 현 상태를 유지했다가 손해를 봤을 때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본인의 행동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파동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신의 것. 이직 후 결과가 좋지 못하면 후회가 깊은 것도 그래서다.
이직 스트레스 이렇게 날려보자 3 STEP
1. 버나드 쇼는 말했다. 할 수 있는 자는 행하고 할 수 없는 자는 가르친다고.
새 조직에 들어서면 전과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접하게 된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주말도 반납하고 일한다. 이동 거리가 멀어졌다면 출퇴근 시간도 바뀌고 전철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아진다. 인간관계도 다시 쌓아야 한다.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이전 직장의 익숙함이 그리워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한다.
그러나 '뜀뛰기를 잘못했다'는 암담함은 잠시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는 '뛰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마스 길로비치(T. Gilovich)와 빅토리아 메드벡(V.H. Medvec)의 연구 결과(The Experience of Regret: What, When and Why, 1995)를 보자. 이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하지 않았던 행동에 대해 더욱 후회했는데, 그 비율이 90%에 달했다. 실제로 실행한 것에 대한 후회는 겨우 10%에 불과했다. 길을 헤맨 것보다는 다른 길을 시도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깊었다는 뜻이다. 이직한 뒤에 예상과 다른 전개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가? 만약 이직을 포기하고 이전 회사에 머물렀다면, 나중에는 회사를 바꾸지 못했다는 후회가 발목을 잡는다. '왜 그때 용기 있게 이곳을 박차고 나가지 못했나!'라는 자책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것보다 진하다.
2. '희망고문'에서 벗어나자
이직한 회사에서 문제가 속속 발견되면 다른 회사를 다시 알아봐야 할까? 그보다는 현재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좋겠다.
하버드대학의 심리학자 대니얼 길버트(D. Gilbert)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사진을 선택하게 했는데, 한 반에는 사진을 한 번 선택한 뒤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일러줬고 다른 반에는 바꿀 수 있다고 여지를 줬다. 이후 사진에 대한 만족도를 검증해보았더니 선택을 다시 할 수 없었던 학생들이 그들의 선택에 보다 흡족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괴로워진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재이직을 시도하면 또 다른 좌절감이 시작될 수도 있다. 점프를 자꾸 하면 무릎관절염을 얻게 되듯, 계속되는 환경 변화는 만족으로 이어지기는커녕 철새의 낙인, 역마의 짐으로 되돌아온다.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생각하며 지금 회사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에 만족하고 안정을 찾게 되는 비법이다.
3. Black, 그 매력적인 색
나의 선택은 검은 색이었다고 자책하고 있는가? 더 밝은 색, 매력적인 색을 택할 수도 있었다고. 사실 검은색은 창조의 바탕이며 변화의 시작이다. 검정의 명도는 0인데, 0은 기준점이며 양수와 음수의 구별점이다. 어떤 색과 섞어도 검정색을 유지하는 것도 다른 색들과 구별된다. 이직 후의 고민은 당연하며, 다른 직급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면 더하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로 선을 그은 다음에는 현재 회사의 장점을 찾아보자. 지금 눈앞이 캄캄한 것은 갑갑한 벽이 빛을 가리고 있어서가 아니라, 검고 광대한 우주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글 이현수(일상 심리 전문 작가) 사진 포토파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392호(13.08.27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